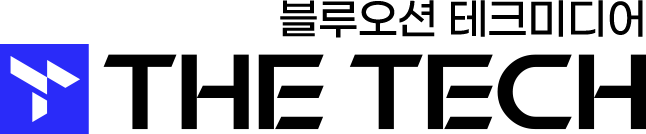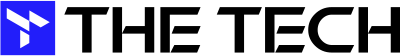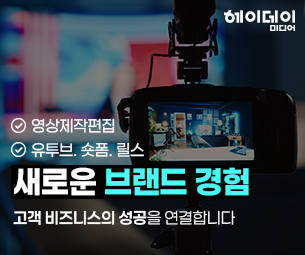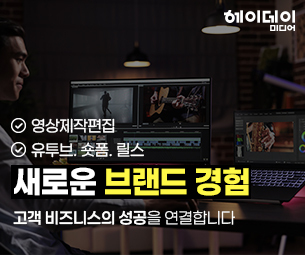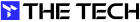![[사진=클립아트코리아]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8736375946_26a11d.jpg?iqs=0.7934864131511877)
[더테크 서명수 기자] 중국 주요 경제지표가 7월 들어 일제히 둔화하며, 하반기 경기 하방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KOTRA 베이징무역관 보고서와 중국 국가통계국, wind, BOCI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산업생산·소비·투자 등 내수 중심 지표가 6월 대비 모두 약화했다.
7월 중국 산업생산 부가가치 증가율은 5.7%로 6월 대비 1.1%p 하락하며 2024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자·기계설비 분야는 여전히 고성장세를 유지했다. 소형 컴퓨터(-10.1%)와 휴대폰(-5.2%) 등 전자제품 생산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경기선행지수인 PMI도 4월 이후 4개월 연속 기준선 50% 이하를 기록하며 경기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 회복세도 제한적이다. 7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3.7%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외식 소비 증가율은 6월 0.9%에서 7월 1.1%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1~7월 누계 증가율은 5% 아래로 떨어졌다.
투자는 부동산(-12%)과 인프라·제조업 투자 둔화 영향으로 1~7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1.6%에 그쳐 2020년 10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1%대로 위축됐다. 민간 부문 투자(-1.5%)는 3년 연속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수출은 벌크 상품 수요 개선과 EU·아세안 수출 호조로 7월 7.2% 성장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8월부터 미국 신정부의 고관세 본격 시행이 예고돼 하반기 수출 둔화 가능성이 높다.
![중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및 전망치. [자료=중국 국가통계국,wind, BOCI Research.]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8739377139_e4fc5b.jpg?iqs=0.5765743198912534)
상반기 중국 경제는 미국 고관세 발효 전 수출 앞당기기와 강력한 경기부양책 영향으로 5.3%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하반기는 상호관세 본격 시행, 공급과잉 심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상반기의 모멘텀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성장동력 약화에 작년 4분기 성장률 반등에 따른 역기저효과까지 겹치면서 4분기에는 44.5% 수준으로 예산되며. 다만 연간 5% 내외의 성장률 목표 달성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미중 상호 추가 관세 영향으로 대미국 수출 회복은 제한적이다. Q3 예상 성장률은 △2%, Q4는 △4%로 연간 0%대 성장에 머물 전망이며, BOCI 리서치 분석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Q4 △7%까지 하락할 수 있다. 수출 둔화는 제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출 관련 제조업 투자는 2024년 13.9%에서 2025년 상반기 11.5%로 둔화했으며,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전인 3월까지는 14.6%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4~5월 무역 경쟁 심화로 6월에는 8.2%로 크게 떨어졌다.
공급과잉 심화와 외수 부진은 하반기 중국 제조업 투자 둔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대형 전력·수리시설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전체 고정자산투자 하락세를 방어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공공사업 인프라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했으며, 전략·중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8,000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배정했다.
중국 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인 소비는 정부 보조금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외식 소비 부진과 선택형 소비재 저조로 회복 폭은 제한적이다.
품목별로는 식품, 액세서리, 스포츠·오락용품, 가전·음향설비, 문화·사무용품, 가구·통신설비가 비교적 회복세를 보였지만, 의류와 화장품 등 선택형 소비재는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중국 정부는 개인대출 이자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내수 진작 의지를 보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로 인한 소득 불안으로 소비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KOTRA는 “외수 부진, 공급과잉 심화, 내권식 경쟁 억제 등 요인이 중국 투자와 수입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들이 취급 품목과 관련 업종의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