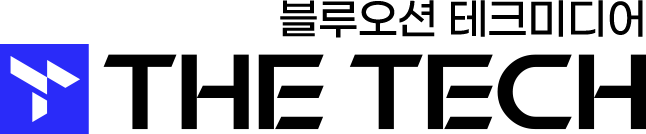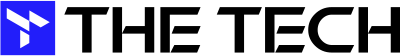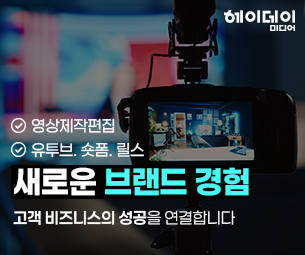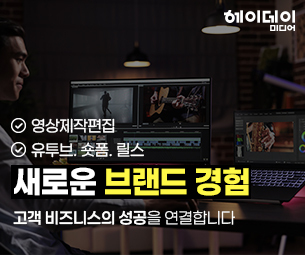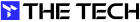![전 세계 희토류 채굴량 추이 (1994~2024) [자료=U.S. Geological Survey, Statista 재가공/KOTRA]](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427047913_b6b423.png?iqs=0.19888176823218584)
[더테크 이승수 기자] “희토류 자석이 없으면 파워스티어링부터 변속기까지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며, 결국 미국 내 자동차 조립 라인의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9일, 완성차와 부품사를 대표하는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과 자동차 및 부품제조업체협회(MEMA)가 백악관에 보낸 공동 서한 내용이다.
29일 해외시장뉴스 코트라 디트로이트 무역관이 최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 중국 정부는 희토류 원소 7종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다. 특히 네오디뮴(NdFeB) 자석의 핵심 합금 원소인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은 수출 승인률이 25%에 불과해 미국 자동차 공급망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실제로 포드(Ford)는 5월 시카고 조립공장에서 희토류 자석 확보 지연을 이유로 일시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또한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 구동 모터뿐 아니라 내연기관차의 파워스티어링, 시트 조절 모터, 오디오 시스템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자동차 한 대에는 10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소형 전동 모듈이 탑재되며, 상당수가 고성능 영구자석 기반으로 작동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네오디뮴 자석 수요가 204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공급 구조다. 중국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희토류 채굴량의 70%, 정제 능력의 85%, 자석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전 공정을 독점하고 있다. 미국도 일부 채굴은 진행 중이지만 정제와 자석 생산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 전체 수입의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국방생산법(DPA)을 근거로 희토류 내재화를 국가 전략으로 규정하고 공급망 구축에 착수했지만, 2025년 현재까지 진전은 주로 채굴과 정제 단계에 그치고 있다. 정제 과정의 까다로운 기술, 환경 규제, 인허가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석 생산 역량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만, 정부와 민간의 투자 움직임은 본격화되고 있다. 2025년 7월 미 국방부는 MP Materials에 4억 달러를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되었으며, 가격 보장 계약도 체결했다. Apple도 MP Materials와 5억 달러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해 미국 내 생산 및 재활용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재활용 기반 확대도 병행되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재활용 금속 생산 시 비용의 10%를 세액 공제로 지원하고, 에너지부는 회수율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상업화 제약이 여전해 재활용은 중장기적 보완 수단으로 평가된다.
![플랫폼의 62kW급 유도 모터 구성. t사진=GM]](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4270475344_f678be.png?iqs=0.5529378245466542)
한편, GM, BMW, Ford 등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희토류를 쓰지 않는 구동 모터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유도 모터, 페라이트 자석 기반 모터, 스위치드 릴럭턴스 모터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고성능 전기차 구동계에서의 상용화는 여전히 기술적 한계가 크다. GM과 Stellantis는 미국 소재기업 Niron Magnetics에 전략 투자해 희토류 프리 자석 개발을 지원 중이며, EU도 대체 자석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결국 희토류 자석 하나가 미국 자동차 조립 라인을 멈추게 만들었다. 공급망 불안이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며 업계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미국은 채굴부터 정제, 자석 제조까지 밸류체인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환경 규제와 기술 격차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희토류 저감 기술과 자석 대체 기술 확보가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기업 역시 미국 내 공급망 재편 흐름에 맞춰 전략적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