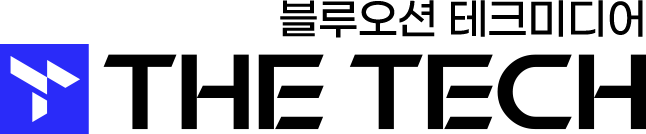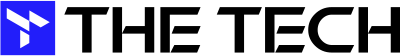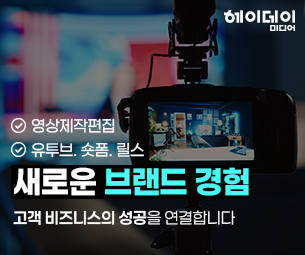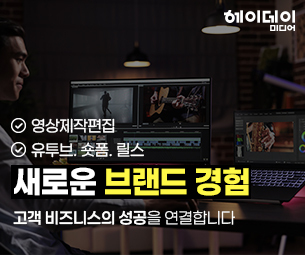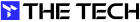![[사진=클립아트코리아]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56354573_b85063.jpg?iqs=0.08186479779805778)
[더테크 이지영 기자] 국내 연구진이 우울증이 단순한 신경세포 손상 때문만이 아니라, 특정 신경 신호 경로의 교란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KAIST는 생명과학과 허원도 석좌교수 연구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아주대학교의료원 병리과 김석휘 교수 연구팀과 함께 극단 선택을 한 환자의 뇌 조직을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RNA 염기 분석과 면역조직화학 분석을 통해 우울증의 분자 기전을 규명했으며, 광유전학 기술을 활용해 동물모델에서 항우울 효과 회복 가능성도 입증했다.
연구는 특히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해마 중 ‘치아이랑’ 부위에 집중됐다. 연구팀은 스트레스를 유발한 우울증 마우스 모델에서 성장인자 수용체인 FGFR1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FGFR1을 제거한 조건부 녹아웃(cKO) 마우스에서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고 우울 행동이 빠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FGFR1이 정상적인 신경 조절과 스트레스 저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어 연구팀은 FGFR1을 빛으로 활성화하는 ‘optoFGFR1 시스템’을 개발해 FGFR1이 부족한 우울증 마우스에서 이를 활성화했다. 그 결과 항우울 효과가 회복되는 현상을 확인했으나, 노화된 우울증 마우스에서는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연구진은 ‘Numb’ 단백질이 노화된 뇌에서 과도하게 발현돼 FGFR1 신호전달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실제로 사후 인간 뇌 조직 분석에서도 고령 우울증 환자에게서만 Numb 단백질의 과발현이 확인됐다. 연구팀이 마우스 모델에서 Numb을 억제하는 유전자 조절 도구를 활용하고 FGFR1 신호를 동시에 활성화하자, 이전까지 회복되지 않던 신경 발생과 행동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
허원도 KAIST 석좌교수는 “이번 연구는 우울증이 단순히 신경세포 손상 때문만이 아니라 특정 신경 신호 경로의 교란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성과”라며 “특히 고령 환자에게 항우울제가 듣지 않는 분자적 원인을 규명하고, Numb 단백질을 표적으로 한 새로운 치료 전략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KAIST의 뇌신경과학 역량과 국과수의 법의학 기반 뇌 분석 기술이 결합된 융합연구 성과로, 향후 정신 질환 기초 연구와 임상 적용 간 연결 고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KAIST 생명과학과 신종필 박사, 허원도 교수. [사진=KAIST]](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5635775016_afbc71.jpg?iqs=0.9009762501878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