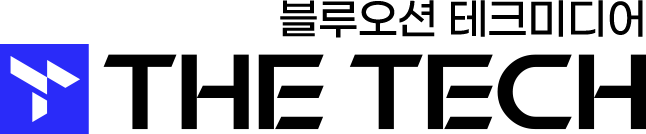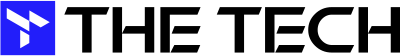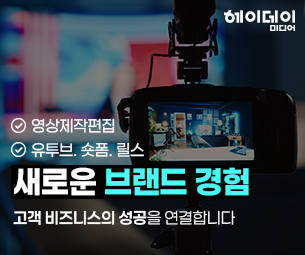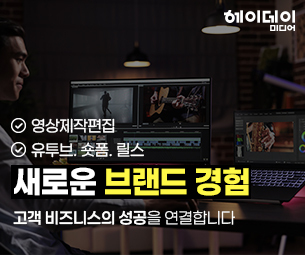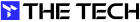![[사진=더테크 DB]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2635745053_08e8df.jpg?iqs=0.5915505847826664)
[더테크 서명수 기자]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속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을 본격 추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를 계기로 시작된 소부장 자립화 노력이 이제는 AI 기반의 초혁신 기술 확보와 글로벌 시장 주도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당시, 위기를 ‘소부장 자립화’의 기회로 전환하며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등 핵심 품목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 결과 대일 의존도는 2019년 16.9%에서 2024년 13.9%로 줄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인해 한국 소부장 산업은 일본 수출규제를 넘어서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부장 산업의 ‘기술·시장·생태계’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국가 간 경제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보조금과 관세 등 다양한 정책을 총동원하고, 희토류·흑연 등 첨단 핵심광물 확보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AI의 급속한 확산은 소재 개발방식 자체를 혁신하며 신소재를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동시에 탄소중립 규제가 강화되며 환경과 무역이 결합된 새로운 글로벌 규제 시대가 도래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소부장 산업은 수출 3,600억 달러, 무역흑자 1,000억 달러를 상회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생산 규모는 2020년 847조원에서 2023년 1,077조원으로 증가했고, 기업 수도 2만9,614개에서 3만84개로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경쟁국 대비 첨단기술 수준은 미국 100을 기준으로 한국이 83.3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며 글로벌 선도기업 수도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4대 도전기술’을 중심으로 AI 기반 R&D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소재 데이터를 현재 430만건에서 2030년까지 1,500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5대 과제를 추진한다. 또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R&D에 대해 특허 우선 심사와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 기업 지원도 확대해 ‘소부장 으뜸기업’을 현재 100개사에서 200개사로 늘리고, 프로젝트당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슈퍼乙 프로젝트’를 15개 과제로 확대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선다.
해외 수출 시장에서는 한·미 조선 협력, 인도 반도체 협력(ISM) 등 국가 간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KOTRA 전담 무역관을 배치해 인증, 물류, 마케팅 전 과정을 지원하며, 주요국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내수시장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AI, 양자, 방산, 재생에너지, 항공·드론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주도 투자 프로젝트를 확대해 새로운 소부장 내수시장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또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함께 성장하는 소부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기반 다수요-다공급 R&D 협력모델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10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산 소부장을 실제 생산라인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도 새로 도입한다. 이와 함께 소부장 산업법 개정을 통해 특화단지 지정 연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근거 마련,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소부장 특별회계를 전년 대비 1,467억원 늘어난 2조 4,31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첨단산업기금과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핵심광물 자립화·수입처 다변화·공공비축 확대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AI 신소재 개발을 통한 기술 초격차 확보, 글로벌 선도기업 200개 육성, 10대 협력 생태계 완성형 모델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AI와 첨단기술이 제조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정부는 기업과 함께 자립형·혁신형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