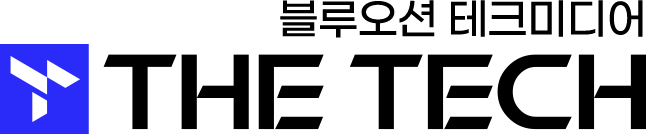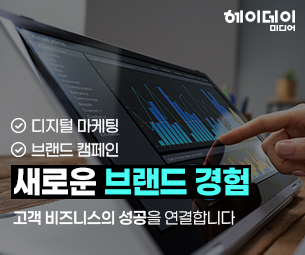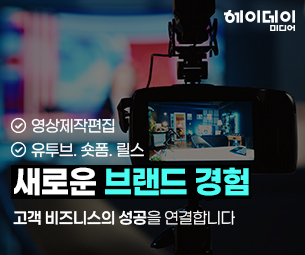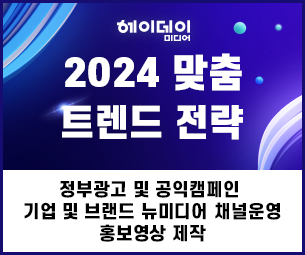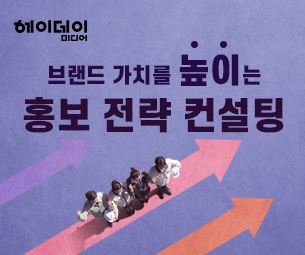[더테크 뉴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발전으로 꼽히는 열전소재를 찍어내 열전발전기의 내구성과 효율을 크게 높인 기술을 개발했다.
![구리-셀레나이드(Cu2Se)의 3D 프린팅 공정 연구 그림. [사진=UNIST]](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10624/art_16237280618623_f9ee64.jpg)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신소재공학과 손재성·채한기 교수팀과 애리조나 주립대 권범진 교수이 열전소재인 구리-셀레나이드(Cu2Se)를 벌집 형태로 3D 프린팅해 발전기 내구성과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진은 열전소재로 이뤄진 잉크를 새롭게 개발해 3D 프린팅으로 복잡한 벌집 구조를 찍어낼 수 있었다. 손재성 교수는 "3D 프린팅 기술로 버려지는 원료 손실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이라며 "경량화와 내구성이 동시에 필요한 우주·항공 기술과 자동차 산업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열전발전은 온도차를 전기로 바꾸는 차세대 발전이다. 공장이나 항공기·자동차에서 나오는 폐가스의 열을 전기로 바꿀 수 있어, 에너지 재활용 기술로도 주목받는 발전기술이다. 열전소재 양 끝단에 온도차가 생기면 소재 내부에 전류가 흐르는 힘이 생기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 발전기 핵심인 열전소재는 다른 소재군과 비교해 충격 등을 견디는 기계적 내구성이 약하다. 또 작동 과정 중에 반복적으로 열 팽창과 수축, 기계 진동에 노출돼 미세균열과 같은 구조적 손상을 입기 쉽다. 내구성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이유다.
공동 연구팀은 열전소재를 세포형 구조(cellular architectures)로 제작하는 기술을 새롭게 선보였다. 세포형 구조는 단위 세포구조 여러 개가 빈틈없이 연결된 형태를 말한다.
벌집처럼 단위세포를 육각기둥 형으로 만들면 외력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열전소재 원료를 더 적게 써 경량화도 가능하다.
![왼쪽부터 손재성 교수, 주혜진 연구원, 추승준 연구원, 채한기 교수. [사진=UNIST]](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10624/art_16237280614901_619c7a.jpg)
이 발전기 핵심인 열전소재는 다른 소재군과 비교해 충격 등을 견디는 기계적 내구성이 약하다. 또 작동 과정 중에 반복적으로 열 팽창과 수축, 기계 진동에 노출돼 미세균열과 같은 구조적 손상을 입기 쉽다. 내구성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이유다.
연구진은 열전소재를 세포형 구조로 제작하는 기술을 새롭게 선보였다. 세포형 구조는 단위 세포구조 여러 개가 빈틈없이 연결된 형태를 말한다. 벌집처럼 단위세포를 육각기둥 형으로 만들면 외력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열전소재 원료를 더 적게 써 경량화도 가능하다.
연구팀은 구리-셀레나이드를 3D 프린팅용 잉크로 만들기 위해 무기물 셀레늄 결합제를 사용했다. 점도가 높은 잉크 형태로 열전 소재를 만들려면 결합제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쓰는 유기물 결합제는 열처리 공정으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아 전기 전도도를 떨어뜨려 효율을 낮추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벌집 형태의 열전 소재로 발전기를 만들었을 때의 성능 실험 결과에서는 직육면체 평판 형태의 발전기보다 온도 차를 전기로 변환하는 성능이 26%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벌집 형태가 열전 소재에 붙은 전극의 열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열이 주변부로 확산해 온도 차가 줄어들면 열전발전의 효율이 낮아진다.
손재성 교수는 “버려지는 원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이라며 “경량화와 내구성이 동시에 필요한 우주·항공 기술과 자동차 산업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쳐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6월 10일 온라인판에 발표됐다. 연구 지원은 삼성전자의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을 통해 이뤄졌다.